미완의 자리에서 자라는 소설 속 성숙
흔들리고 불안정한 순간들 속에서 이미 시작된 성숙의 또 다른 얼굴

성숙은 흔히 결실과 완성의 순간으로 떠올려집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어떤 상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성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완벽히 닿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미숙하고 불완전한 과정을 끌어안으며 조금씩 이어지는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김금희·최은영·백수린의 소설을 읽다 보면, 성숙이란 단단히 다져진 결말에서가 아니라 불안정한 순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인물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상처를 안고, 실패하며,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미완의 자리에서 성숙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설프고, 상처투성이며, 때로는 길을 잃은 듯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성숙을 경험합니다. 성숙은 끝에 다다라 얻는 보상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쌓이고 남는 감각입니다. 이 글은 세 작가의 소설을 통해, 성숙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고자 합니다.
불안정 속의 신뢰 — 김금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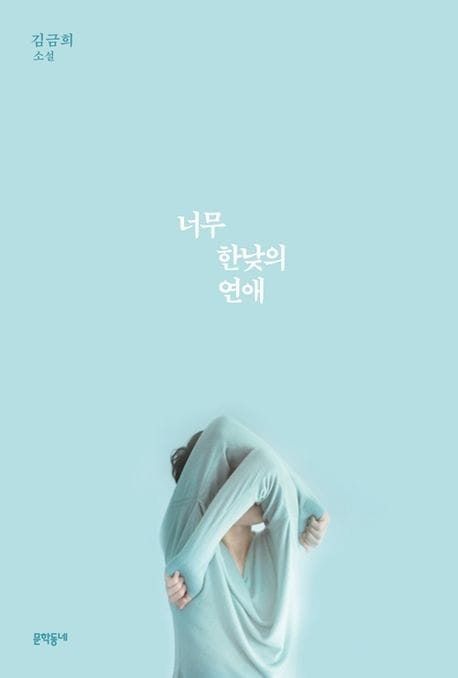
김금희의 인물들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관계 속에 서 있습니다. 《경애의 마음》에서 경애는 어린 시절 폭력과 상처를 겪고, 직장에서도 소외당합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스러져간 이들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짙게 드리우지요. 그러나 그런 상처 속에서도 경애와 동료 인물들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미약한 위안을 건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도, 곁을 내주는 순간에 신뢰가 자라납니다.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는 오랜만에 재회한 옛 연인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벽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는 다시 이어지지 못하고, 미래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나눈 대화와 시선, 그 불완전한 만남에서 독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성숙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어긋남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김금희가 보여주는 성숙은 화해와 합일이 아닙니다. 끝내 남는 균열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기대며, 믿으려는 마음. 그것이 불안정 속에서 피어나는 신뢰이고, 성숙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안은 채 함께 머무는 과정임을요.
상실과 이해의 시간 — 최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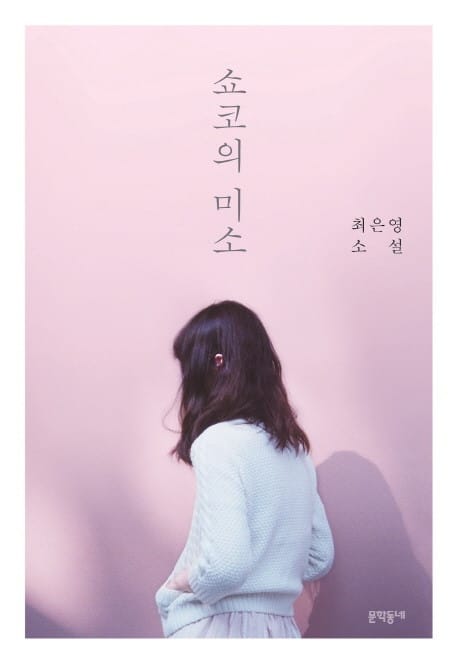
최은영의 서사에는 늘 상실이 있습니다. 《쇼코의 미소》 속 ‘나’와 쇼코는 국경과 언어, 성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끝내 완전히 메워지지 않습니다. 다정함 뒤에는 어쩔 수 없는 어긋남이 남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끝까지 공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한 관계가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도 곁에 머물려는 태도, 그것이 최은영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성숙입니다.
《밝은 밤》은 네 세대의 여성 서사를 교차시킵니다. 증조모,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현재의 ‘나’까지. 이들의 삶은 역사의 파도에 흔들리고, 선택하지 못한 삶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이어 말하고, 기억을 전하며, 단절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성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을 지우려 하기보다 품고 살아가는 지속성.
최은영이 그려내는 성숙은 극복이 아니라, 상실과 함께 살아내는 이해의 힘입니다. 오히려 상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지속성 속에서 발견됩니다. 어쩌면 성숙이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능력이 아니라 상실을 안고도 이해하려는 용기임을 작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불안한 젊음의 고백 — 백수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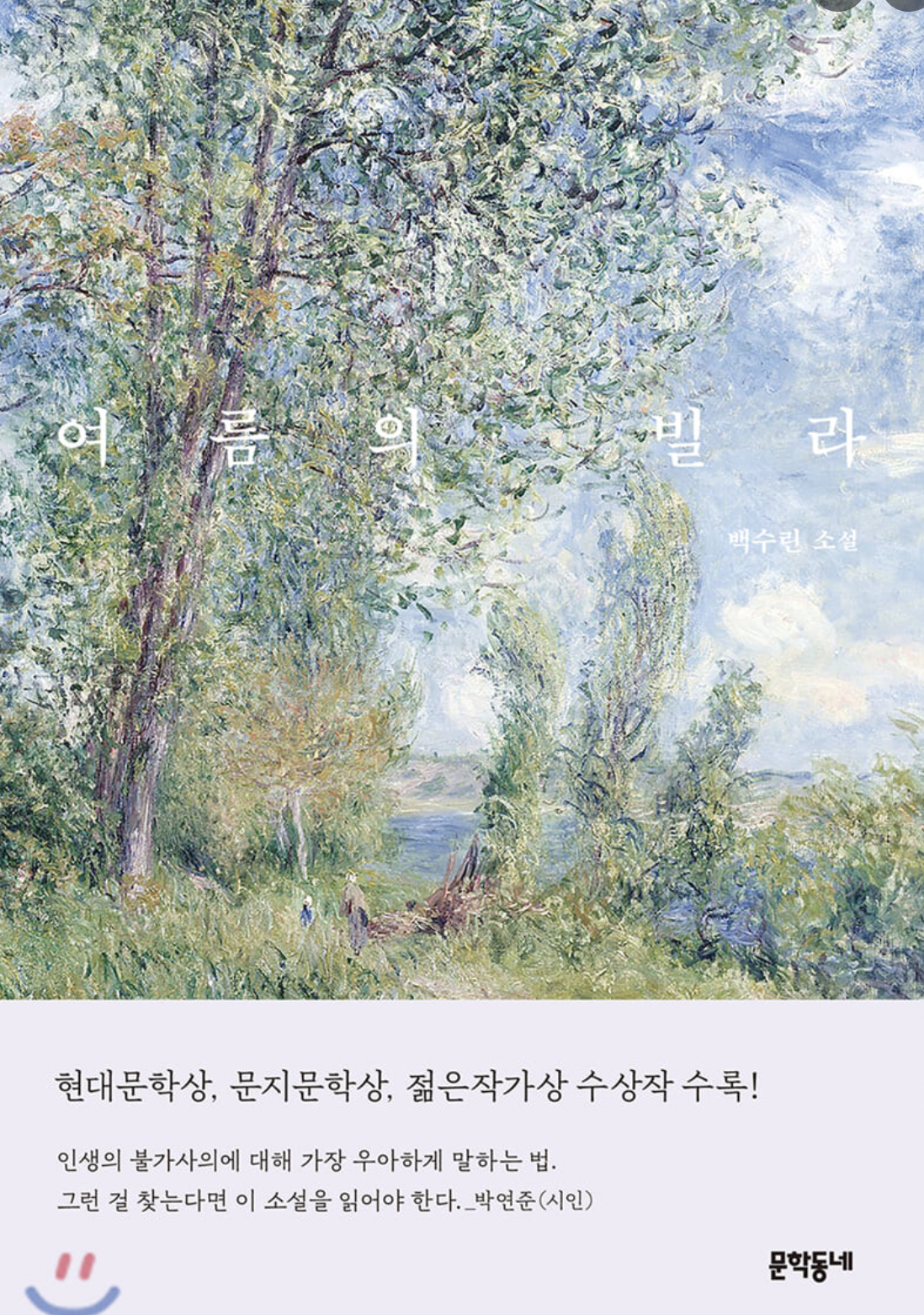
백수린의 소설은 젊음의 불안과 고백을 섬세하게 담습니다. 《여름의 빌라》 속 인물들은 임시로 머무는 공간에 모여듭니다. 이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떠돌고,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끝내 확신에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흔들림이 소설을 이끌어갑니다. 빌라는 잠시 머무는 자리이자, 불완전한 삶의 은유가 됩니다.
《폴링 인 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소속감을 얻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낍니다. 정체성은 흔들리고, 자신이 어디에 속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수린의 인물들은 그 불안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백하고, 말로 드러내며, 타인과 나누려 합니다. 그 고백 자체가 성숙의 출발점이 됩니다.
백수린이 보여주는 성숙은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정하고 미완의 시간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용기 자체가 성숙의 태도입니다. 독자는 그녀의 서사를 통해 성숙이란 완결된 자기 확립이 아니라,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불안을 말로 옮기는 행위임을 느낍니다.
김금희·최은영·백수린의 소설은 성숙을 완결된 상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물들은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상실을 극복하지 못하며, 불안정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그 미완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어긋난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려는 마음, 상실을 안고도 이해를 이어가려는 태도, 불안정함을 고백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성숙의 다른 얼굴입니다.
성숙은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고,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말할 때, 그것은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미완 속에 서 있으면서도 나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자는 이 세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자기 삶의 미완 또한 성숙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