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하지만 고립되지 않는 예술
하나의 감각에 나를 맡길 때 비로소 열리는 세계

현대인은 감각 과잉의 시대에 산다. 눈으로는 영상을 보고, 귀로는 음악을 듣고, 손으로는 스크롤을 내리며 오감을 동시에 소모한다. 우리는 이것을 '멀티태스킹'이라 부르며 유능함의 척도로 삼지만, 실상 우리는 어떤 감각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 스스로 '반쪽짜리'가 되기를 자처한 예술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고, 코를 가까이 대라고, 혹은 만지지 말라는 금기를 깨라고 명령한다. 하나의 감각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만드는 이 불친절한 예술들 앞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을 마주하게 된다.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온전히 믿고 깊이 파고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는 영화
인간의 뇌는 눈을 감는 순간 시각 피질의 전원을 끄지 않는다. 대신 그 에너지를 청각으로 돌려 소리를 ‘보려’ 애쓰기 시작한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감각의 전이, 즉 교차 모달(Cross-modal) 현상이라 부른다.
밴드 스완스(Swans)의 음악을 듣는다는 건 이 뇌의 착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실험과도 같다. 특히 'Soundtracks for the Blind'(1996) 앨범은 제목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영화를 위한 사운드트랙'이다.
이들의 사운드는 멜로디를 감상하게 두지 않는다.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는 노이즈, 끝없이 반복되는 리듬이 청자를 압도해 눈을 뜨고 있어도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끌고 간다.
청각에 온전히 맡겨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장면이 생겨난다. 소리가 풍경이 되고, 리듬이 화면 전환이 된다. 시각을 차단하고 청각에만 의존할 때, 우리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소리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창조자가 된다. 의존은 세계를 좁히는 대신, 오히려 세계를 확장한다.
보이지 않는 기억의 지도
후각은 인간의 오감 중 유일하게 이성의 필터인 시상(Thalamus)을 거치지 않고 대뇌변연계로 직행한다. 이성을 건너뛰고 기억이나 감정에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다. 냄새를 맡으면 옛 기억이 불쑥 떠오르는 경험이 있지 않는가? 이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프룸스트 현상'이라는 메커니즘이다.
과거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은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聞香)’고 표현했다. 시셀 톨라스(Sissel Tolaas)의 ‘냄새 지도’는 이러한 감각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복원한다. 그녀는 도시의 세밀한 냄새를 채집해 지도를 만들었다. 시각적 지도가 감추고 있는 빈민가의 땀 냄새, 강변의 비린내를 통해 우리는 도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다. 시각은 사물의 표면을 훑지만, 후각은 대상의 가장 내밀한 본질을 파고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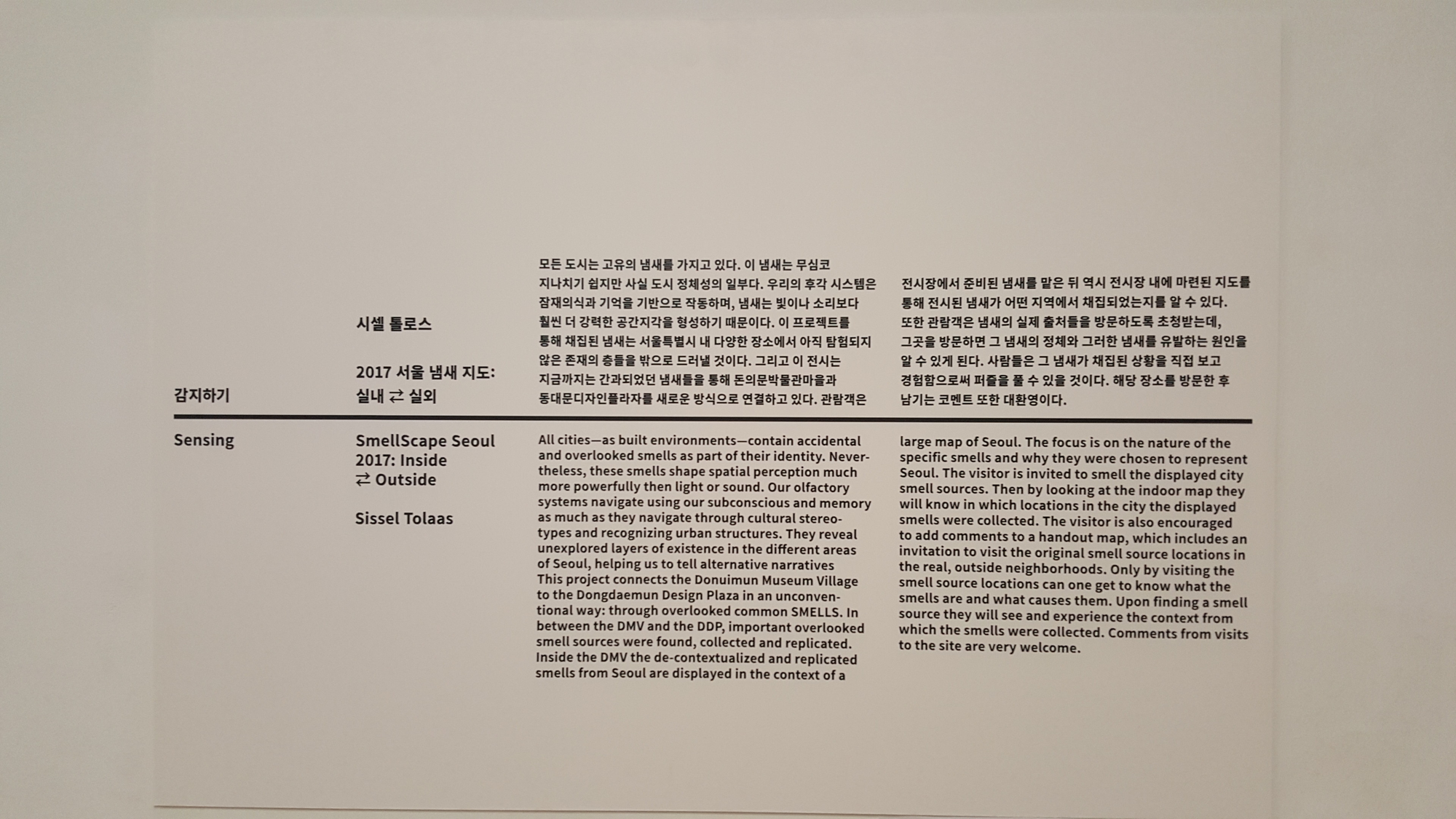
시각이 표면을 보여준다면, 후각은 본질에 스며든다. 의존할 때 우리는 대상의 가장 내밀한 기억, 가장 솔직한 분위기와 연결될 수 있다.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느끼는 온기

'어둠 속의 대화' 는 체험 전시다. 완전한 암흑—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다. 이때 남는 단서는 두 가지뿐이다. 손끝의 감각과, 안내자(로드마스터)의 목소리.
우리는 살기 위해 타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발바닥의 촉감에 민감해진다. 보이지 않으니 의심도, 체면도, 과장도 줄어든다. 대신 ‘의존’이 선명해진다. 우리는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만, 평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고립을 느끼기도 한다. 이 어둠은 그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의존은 나약함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겠다는 용기다. 우리는 의존함으로서 비로소 고립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여전히 독립적인 삶을 꿈꾼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이 성공이라 믿는다. 하지만 앞선 예술들이 보여주듯, 의존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데려가는 통로가 된다.
귀를 기울여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고, 코를 가까이 대야만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며, 촉각에만 맡길 때 비로소 전해지는 온기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감각을 열고, 대상에게 기꺼이 의존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그러니 가끔은 눈을 감고, 혹은 화면을 내려놓고, 하나의 감각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그 ‘의존’의 끝에서 우리는 결코 고립되지 않은 채 오히려 세상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