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 찾는 감각의 균형
사이의 사이를 더 잘게 가늠하는 일

난생처음 기차를 탄 사람의 감각을 상상해 봅니다. 유리창 너머 창틀 뒤편으로 빨려 들어가는 풍경을 보며 바람도 없이 눈으로만 느끼는 속력은 인간의 감각으로 온전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대라는 열차에 탑승한 승객 같습니다. 매일 발표되는 신기술과 공간을 초월해 연결된 인터넷 안에서 우리의 풍경은 너무 빨리, 또 자주 바뀝니다. 유리창 너머에 녹아있는 풍경처럼 일상은 찰나의 인상만을 남긴 채 과거로 빨려 들어갑니다. 너무 빠른 속도와 너무 많은 일이 감각하기도 전에 흘러가 버릴 때 세계는 유리창 너머의 풍경으로 멀어집니다. 해석할 수 없는 풍경 어디에 의미를 둬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어렴풋이 짐작되는 풍경 속에서 시는 세계의 근사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시인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세계의 핵심을 포착해 일상의 언어를 낯설게 엮어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 냅니다. 이 낯섦이 만드는 새로운 이미지와 감각이 그저 짐작되던 것과 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올곧게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시선으로 세계의 핵심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을 통해 기울어진 감각의 균형을 찾아봅니다.
생의 감각이 시간의 감각일 수밖에 없다면
모든 변화는 시간에 기반합니다. 허공을 밀어내고 피어나는 꽃, 뜨거운 태양 아래 푸르른 잎 사이에서 익어가는 샛노란 레몬, 팔랑이며 발치에 떨어지는 나뭇잎, 볕을 마주 보고 놓인 책장 속에서 파랗게 색이 바랜 책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녹는 얼음과 유리컵 표면에 알알이 맺힌 물방울. 일상의 모든 변화가 시간으로 해명됩니다. 이 글 역시 시간 속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거, 대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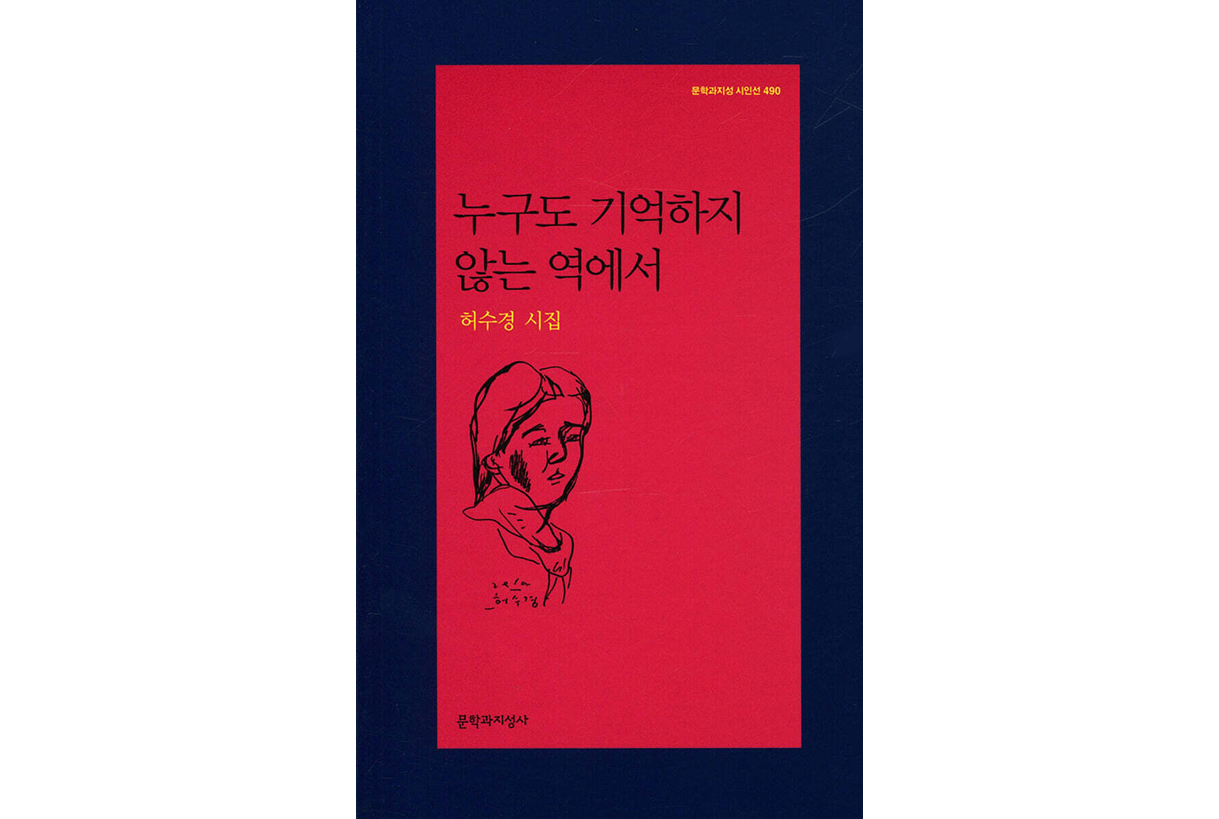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에서 시인은 우리가 지나온 그 오랜 시간을 상상합니다. 시간은 곱씹을수록 이상한 개념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라는 표현 때문인지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긴 흐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까치발을 들고 겨우 서 있을 만큼 얄팍한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 순간 과거로 빨려 들어가며 동시에 미래로 달려 나갑니다. 지금이 사라지며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가 올 것이라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시인은 지나온 줄도 모른 채 지나온, 돌이킬 수 없는 오랜 시간의 모든 사이를 상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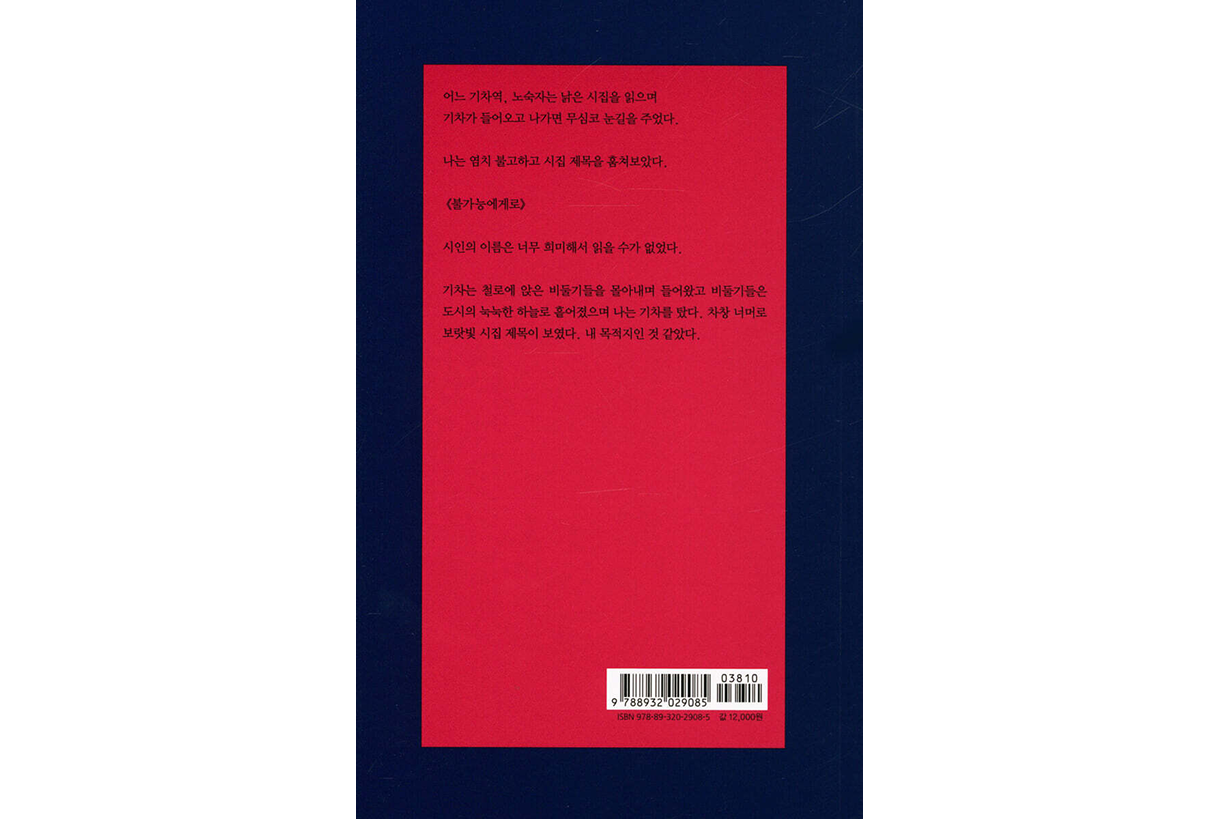
모든 존재가 각자의 시간 선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한다면 우리의 만남은 시간의 겹침입니다. 이 겹침이 지나가면 그 시간의 ‘우리’는 과거로 사라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미래로 달려갑니다. 시간이라는 이 속수무책의 사태가 온갖 감정을 낳습니다. 시인은 지금에 남겨진 생과 죽음에서 지나간 오랜 시간을 상상합니다. 떠난 '가방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무참’한 예감과 눈앞에 ‘타들어 가는 포도나무의 시간’에 대한 상상은 생과 시간의 감각을 맞닿게 합니다. 생의 감각이 시간의 감각일 수밖에 없다면 ‘지금’만이 존재하는 삶에서 떠나버린 오랜 시간은 무엇으로 지금에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매 순간 떠나고 있는 지금에 무엇이 남겨질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기차를 기다리다가
역에서 쓴 시들이 이 시집을 이루고 있다
영원히 역에 서 있을 것 같은 나날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기차는 왔고
나는 역을 떠났다
다음 역을 향하여
-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허수경
슬픔이 영롱해지는 아침
익숙해진 일들로 가득한 아침은 자주 몽롱합니다. 뒤척이는 날이 새고 익숙한 알람 소리가 잠을 깨우면 잠기운을 지울 새도 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몸을 닦고 얼굴을 매만지고 옷을 챙겨 밖으로 갑니다. 매일 걷는 길을 따라, 가야하는 곳에 가기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눈이 떠지는 아침은 어떤가요. 묘하게 푸른 빛을 띠는 고요한 방에서 방금까지 깨어 있었던 듯이 눈을 뜹니다. 시작의 시각이 주는 팽팽함이 감각을 예민하게 일깨웁니다. 예각을 이루는 붉고 푸른 빛이 밤 동안 잠들어 있는 것들의 구석구석을 비추면 세계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영롱한 아침의 고요 속에는 이해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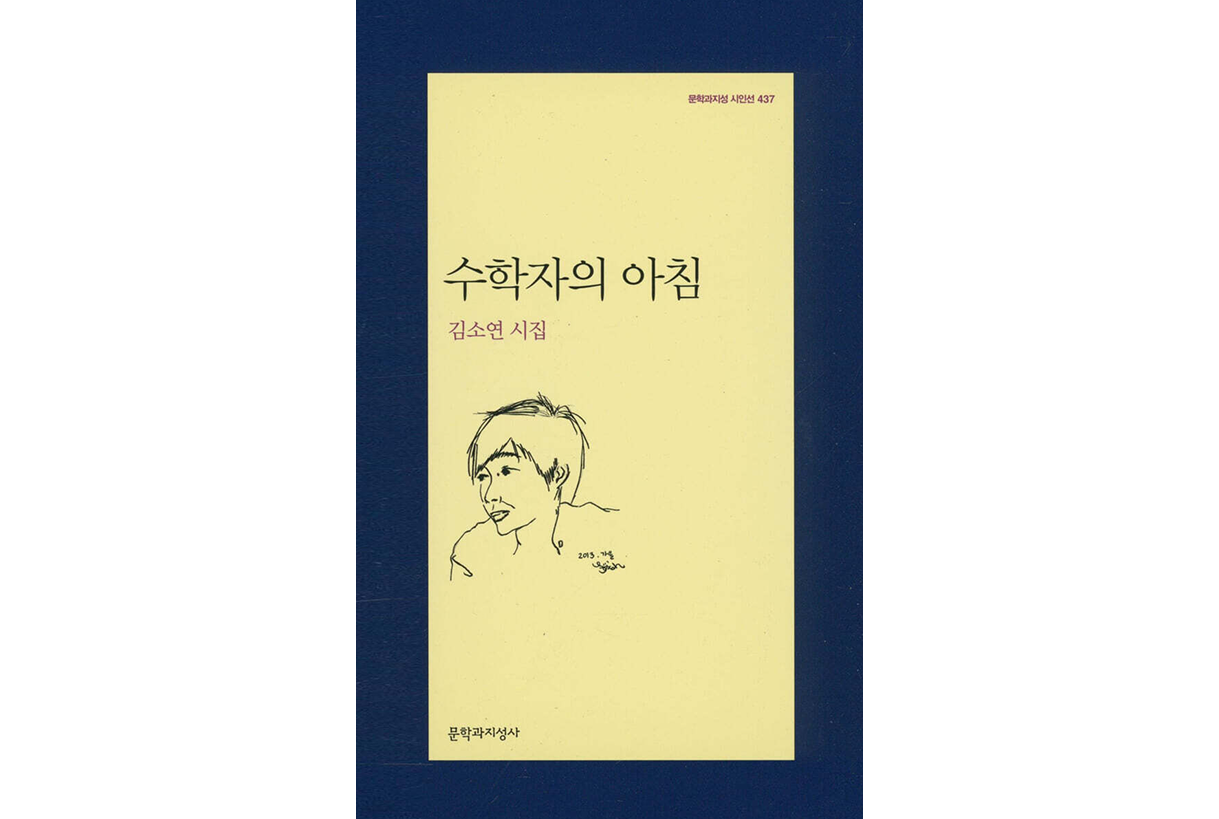
‘깊은 밤이란 말은 있는데 왜 깊은 아침이란 말은 없는 걸까.’ 시인의 이 질문이 낯선 아침을 발명합니다. ‘깊이를 침잠과 몽상의 어두운 밤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이성과 실천의 아침에 두려’는 그의 시도는 몽롱함에서 깨어나 새로운 것들을 포착해 냅니다. 고요한 풍경이 실은 정지해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선은 아침의 팽팽함 안에서 뾰족하게 빛을 냅니다. ‘이미 이해한 세계는 떠나야 한다.’ 이 명제 앞에서 더 이상 이해해야 할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허무를 이겨내기 위해 그는 최대한 뾰족해지려 합니다. 그 시선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된 일들이 새로이 발생’하는 깊은 아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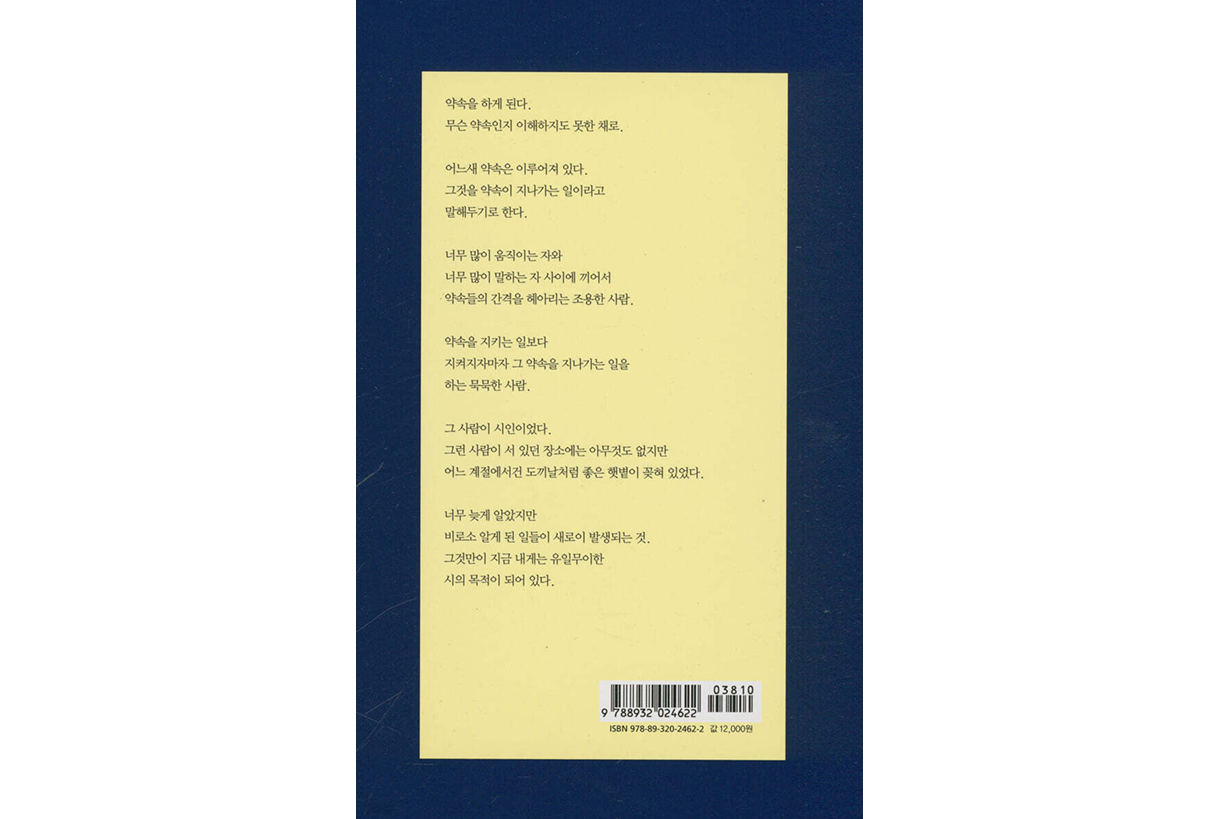
이성으로 이해하는 세계는 불현듯 삶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깊은 아침에서 파낸 무의미가 슬픔을 부릅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침은 오고 시인은 계속해서 뾰족한 아침을 발명합니다. 그 뾰족함에 아주 자그마한 슬픔이라도 ‘동그란 비눗방울’처럼 터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그 순간이 마구 중첩되어 슬픔이 터지는 소리가 이 ‘암울한 도시’를 가득 메울 때까지. 발문에서 평론가 황현산은 시인의 이런 태도에서 ‘씩씩함’을 읽어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어김없이 있었던 그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들어 가장 깊은 생각들을 캐’내어 ‘말’로 뱉어냅니다. 삶의 무상함에 소스라치다가도 다시 집어 든 슬픔이 영롱해지는 아침입니다.
애도를 멎게 하는
자장가가 되고 싶다.
- 『수학자의 아침』, 김소연
세계는 인식됨으로써 존재하고 기울어진 감각은 세계를 흐릿하게 인식합니다. 어떤 발화는 세계를 어림짐작하던 우리의 인식에 작은 홈을 파냅니다. 세계를 인식하는 가늠자가 있다면 시를 읽는 일은 그 도구를 늘이고 또 잘게 나누는 일 같습니다. 시간과 시간 사이, 기쁨과 슬픔 사이, 그리고 그 사이의 사이를 더 잘게 가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쭉 뻗어 절대 닿지 않을 것 같던 끝과 끝이 때때로 흐물거리다 맞붙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