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ㅁㅁ*ㅁㅁ
소연우

그곳은 볕이 유독 잘 드는 마당이었다. 집 안에 뿌리내린 세간들은 전부 밖으로 나와 찬 공기 – 어디까지나 볕에 비해 차다는 것이지만 – 를 쐬고 온몸에 빛을 감았다. 번쩍번쩍. 마당에 있는 사물들은 예외 없이 번쩍거렸다. 이를 곁눈질로 보노라면, 한때 나는 바깥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폐부 깊숙이 파고든다.군데군데 녹슨 가로등 빛이 달과 별의 그것보다 절대적으로 환했던 밤은 다시 오겠다는 낌새만 남기고 사라졌다. 방문에 홀린 듯한 기분이 자욱하게 시야를 덮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절처럼 다가올 때 처연한 소식은 끊기고 예의 밤이 자신도 모르게 도래할지도 모른다. 익숙한 정경의 머리 위에 뚜껑이 보이면, 그것의 존재에 관한 생각으로 시간 쓰기도 전, 온화한 짜임새가 꼼꼼한 솜씨로 뒤탈을 털어내리라. 그 덕에 어떤 감정은 천수를 누리고, 한 사내는 벼르고 있던 일에 말을 버릴 터다.저 멀리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결정의 수리를 원하며 아직 탈 많은 정함이 시원치 않은 미덕에 기대었다.


소연우, Soft colonies 3, 캔버스에 유화, 90.9 x 72.7cm, 2025 / 소연우, Soft colonies 1, 캔버스에 유화, 180 x 120cm, 2025 | 이미지_양승규
제물장을 연 것은 전부터 예정된 일인지 아니면 단순 변덕인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시도조차 검다). 문은 열렸고, 그것을 도로 닫는다고 해도 그 전과 같을 수 없기에 온전히 변화를 느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에 약간의 허탈함이 수반된다. 장 안에는 몇 가지 사항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들 중 대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환기를 반기지 않는 듯한 인상이었다. 짐짓 어기대는 태도가 마음에 걸려 아무 탈 없는 계획을 여러 번 들었다가 놓았다. 부산한 움직임으로 수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 밑으로 흐르지 않는 물. 하얀 고임. 발목에 덜컥 든 밤이 사방에서 장마를 끄집어내려 하였다.물 묻은 손으로 허리춤을 적시며 겨우 마련한 반나절에 창을 여러 개 내었다. 그중 네 개만 제구실을 하고 나머진 생애의 의지와 무관심을 같은 옹기에 담은 채 자꾸만 어제를 길게 늘였다.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는 상상.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상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

뒤뜰에 묻힌 성곽 일부가 괜히 신경 쓰이는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했다. 한 곳에 서 있으면 천장은 떨어질 듯하다. 그렇다고 저 구석에 안기엔 바닥이 솟을지도 모른다. 질서를 약으로 쓰리라, 하고 말한 시절은 이젠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다.주머니 속 호수는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는 파문으로 제 표정을 구성한다. 하늘에 뜬 달이 파랗게 질린 끝에 먹빛으로 수렴한다. 연이은 현상의 우거짐이 허기진 새처럼 지저귐으로써 타성을 양껏 흔들었다.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심란한 생각이 무너지기 전 대상의 파편을 찾을 때 외딴 성은 제 그림자를 놓았다. 그것은 공중에도, 바닥 혹은 신념으로 구성한 가능성의 영역에도 자신의 의지를 맡기지 않았다. 외진 의탁이었다.부유하거나, 나뒹굴거나, 연신 손가락을 꼽지 않고 존재 양식을 펼칠 수 있는 대상 내지 사람을 원한다. 나는 고독에 대한 내성이 있다.


소연우, 그늘, 캔버스에 유화, 37.9 x 37.9cm, 2025 / 소연우, 그늘, 캔버스에 유화, 45.5 x 45.5cm, 2025 | 이미지_양승
저 녀석을 골려 줄 심산이다. 화들짝, 하고 놀라는 표정을 본다면 마음 한편이 넉넉해지리라. 문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가난이 거나하게 취했던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는바, 불을 끈 기억도 없는데 어두운 방 안을 마주한다. 그 아침이 유독 말이 많다면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의 사람과 기껏해야 한 시간 정도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 잠잠하게 각자의 싸움을 맞이하겠지. 기준에 못 미친 자격을 두고 허물없이 아름답다, 허락 없이 아리땁다, 말하는 군중. 그중 파란 하늘을 본 사람들은 절반을 가위질하며 있지도 않는 대상의 존재를 구워삶기도, 극에 달한 싫증으로 내치기도 할 것이다.이미 벌어진 일의 껍데기는 유지한 채 속을 파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작업자들은 덥수룩한 수염을 상징적인 기호처럼 바닥으로 드리우며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다. 그들은 숙련에 숙련을 거듭한 이들로서 솜씨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특이한 점으로 일과 휴식의 경계를 다소 우습게 여기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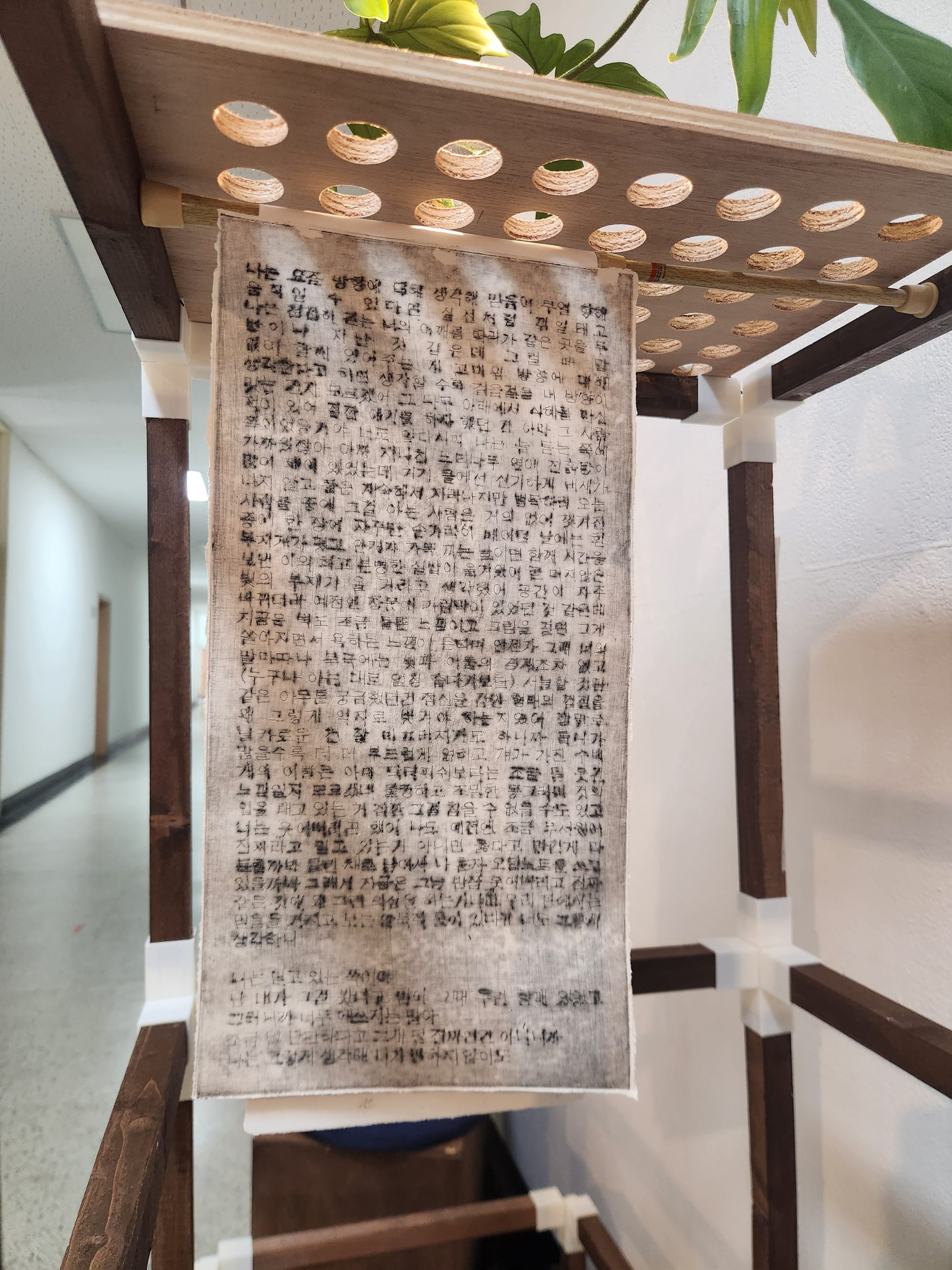
소연우, Cookiecuttershark, 드라이포인트, 종이파레트, 40 x 22cm, 2025 / 소연우, 1도쯤 느린 대화, 드라이포인트, 40 x 22cm, 2025 | 이미지_양승규
우리, 그렇고 그런 날을 나누자. 바람이 불 건, 보기에 딱한 처지가 다리에 부딪히건,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늙은 구름 밑에 연약한 구덩이 완벽하게 쓰러진다. 이는 대상이 사건과 조응한 결과일까, 조용한 대기는 언젠가 죄가 될까. 내가 떠났던 날에 한순간의 줄거리는 여타의 법칙과 상관없이 퍽 스스럼없는 일상을 보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계절, 그 당시 나는 무엇도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흔한 정황도 가지지 못했다. 어깨를 움츠리지 않아도 그런 기분에 빠지는 건 예삿일이 아니었고, 곧게 뻗은 손가락 다섯 – 때에 따라 열 – 에 큼지막한 수레를 달고 다녔다. 순례의 반의반. 또 그 절반의 절반.앞뒤 자르고 되묻던 버릇은 대체 어느 겨울에 팔꿈치를 걸쳤을지. 이젠 구부정한 설명에 결부할 시선은 주위에 널렸다. 춤추는 저울, 그 까닭뿐인 물체에 이념의 손잡이를 달 테다. 남은 하루가 얼마 남지 않은 때 그것을 꼭 움켜쥐고 한없는 존재의 밑바탕을 본다면.


소연우, 활공, 드라이포인트, 20 x 16.5cm, 2023 | 이미지_양승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