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에서는 누구나 잠시 주인공이 된다
완벽하지 않기에 완성되는 서사, 나이키 브랜드 커머셜 3선

AI는 24시간 작동합니다. 피로를 모르고, 식사가 필요 없고, 휴식 없이 일할 수 있죠. 서울과 뉴욕에 동시에 존재하며 학습하는 내용들은 순식간에 서로 공유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7시간을 자야 하고,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하며,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지칩니다. 게다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 알 수 있죠.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신체를 가진 존재의 한계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AI와 비교하면 유한한 인간의 몸에는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AI와 공존하는 시대에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신체를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필자는 나이키 창립자 필 나이트의 멘토이자 육상 코치였던 빌 바워만의 문장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신체가 있는 한, 우리 모두가 운동선수"
(If you have a body, you're an athlete)
바워만 코치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엘리트 선수만 스포츠맨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스포츠맨이지.
우리에게 신체가 있는 한, 우리는 스포츠맨이야.”
_필 나이트, 『슈 독』
운동선수(athlete)의 어원 아틀레테스(athlētēs)에는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기에 투쟁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구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바워만이 말하는 운동선수는 '고난과 투쟁을 통해 목표를 향해 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주인공성과 만납니다. 완벽한 존재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없습니다. 서사는 불완전함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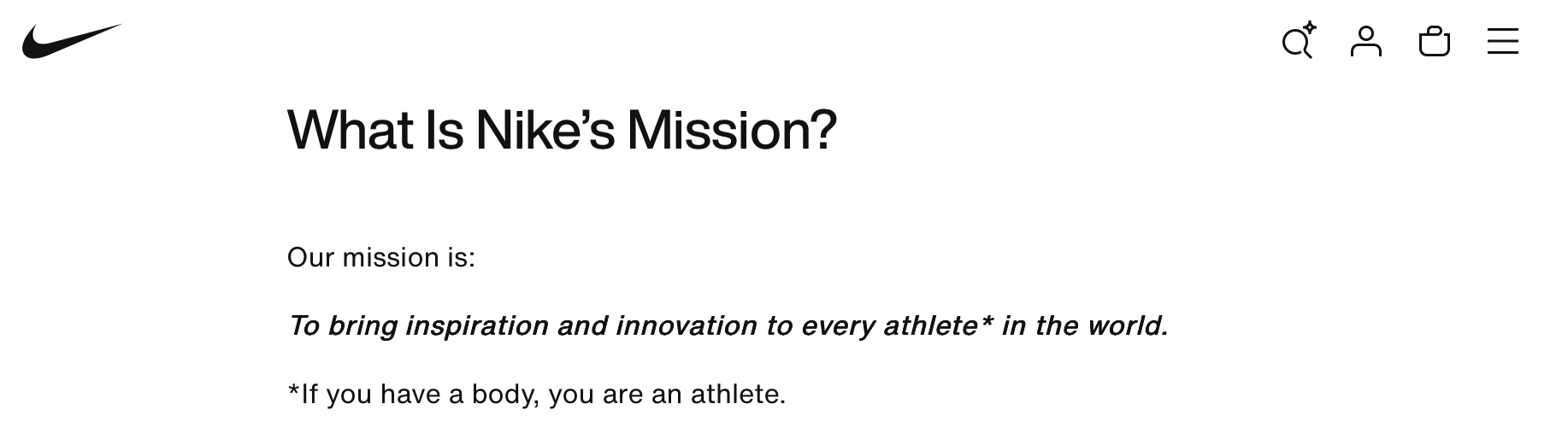
바워만이 건넸던 한마디는 브랜드의 미션이자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광고를 통해 이 믿음을 이야기의 형태로 꾸준히 번역해왔죠. 그래서 나이키의 커머셜에는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만 나오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결핍과 한계를 지닌 이들이 도전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모델이 아닌 서사와 공감의 힘으로 승부하는 이런 광고의 울림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 관계, 시대' 세 가지 키워드로 필자가 아끼는 나이키 커머셜 3편을 골랐습니다. 결핍과 시련이 고유한 서사로 거듭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공성을 일깨우는, 나이키만의 응원법을 소개합니다.
'나'를 믿는 마음,
Dream Crazy (2018)
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꿈이 미친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비웃는다면. 좋은 일이다. '미친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 칭찬이니까.
If people say your dreams are crazy, If they laugh at what you think you can do. Good. Because calling a dream crazy is not an insult. It’s a compliment.
“미쳤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갈라집니다. 비하 혹은 감탄. 출발점은 같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이나 기대치를 벗어나는 것'
2018년, 나이키는 이 이탈의 에너지를 '찬사'로 번역한 광고를 공개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난간에서 트릭을 연습하는 스케이트 보더가 나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어서 신체적, 종교적 다양성을 지닌 선수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개성을 당당히 드러내면서요. 하반신이 없는 레슬러, 휠체어 농구 선수, 뇌종양을 극복한 러너, 히잡을 쓴 복서, 왼손이 없는 풋볼 선수. 익숙한 얼굴의 프로 선수들도 등장하네요. 현재와 크게 대비되는 어린 시절의 과거를 함께 보여줍니다.
유일하게 경기장이 아닌 장면이 있습니다. 나레이션을 맡은 콜린 캐퍼닉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2016년, 미식축구 선수였던 그는 국가 연주간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고, 자유계약선수가 된 이후 다시는 NFL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캐퍼닉에게는 스포츠보다도 중요한 신념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선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선수들을 관통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눈빛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담대한 눈빛.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외부를 향할 때, 선수들은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게 무언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들의 판단이나 평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모욕이든, 칭찬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친 꿈을 좇는 과정,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단절감에서 연결감으로,
'계속해서 움직여라. 자신을. 미래를' (2020)
언젠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그치만 그걸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いつか誰もが降っ, ありのままに生きる世界になるって? でもそんなの待ってられないよ
성인이 되어 돌아본 학교는 작은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 학교는 유일하고 거대한 우주였죠.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모두 같은 교복을 입고 있으면 ‘다름’은 유독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 마주하는 친구들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이키 재팬의 <계속해서 움직여라. 자신을. 미래를>에서는 이 무거운 시선에 위축된 세 명의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재일한국인, 집단따돌림, 흑인혼혈’이라는 차별적 시선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계속해서 그녀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소녀들은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입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시선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힘껏 달립니다. 주위를 살피던 불안한 시야는 어느새 발 앞의 공을 향해 예리하게 좁혀집니다. 일상의 압력에서 잠시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마침내 세 명의 여학생은 경기장에서 5번, 8번, 11번 선수가 되어 만납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팀원들과 모여 승리를 다짐합니다. 동료의 위치를 살피고, 공을 주고받으며, 함께 뜁니다. 교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함께라는 감각’이 운동장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선명해집니다. 단절감에서 연결감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시대가 멈출 수 없는 것,
You can't stop us(2020)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든, 우리는 더 강인해질 겁니다. 함께한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No matter how bad it gets, we will always come back stronger. Because nothing can’t stop what we can do together.
2020년, 팬데믹으로 많은 것들이 멈췄습니다. 전 세계 모든 스포츠도 연기되거나 취소됐죠. 경기장은 텅 비었고, 관중들의 함성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안에 머물렀고요. 하지만 끝내 멈출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이키는 분할 화면을 통해 시대적 결핍과 연결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시각화합니다. 스크린 한가운데 수직으로 뻗은 세로선은 화면을 좌우로 절단합니다. 양쪽에서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분할된 영상들은 움직임을 통해 하나의 영상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화면을 나누던 경계선은 어느새 단절된 시공간을 연결하는 접점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물리적 제약이 역설적으로 서로와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것처럼요.
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는 서사를 만듭니다.
광고는 이 모든 서사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며 끝을 맺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흰색 타이포그래피 'YOU CAN’T STOP SPORT'가 드러납니다. 곧이어 'SPORT' 위로 붉은색 'US'가 강렬하게 덧씌워집니다. 스포츠라는 종목을 넘어, 동시대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US)'로 이어지는 나이키의 열렬한 응원이었습니다.



신체라는 우리의 한계와 가능성
어젯밤에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달리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일어나니까 나가기가 너무 싫네요. 몸은 무겁고, 창가는 서늘합니다. 화장실 바닥은 얼음장이 따로 없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필자가 기계였다면 '눈을 뜨면 밖에 나가서 5km만 뛰고 와' 프롬프트 한 줄이면 됐을 텐데요. 복잡하고, 애매하고, 모순적인 유기체로 산다는 것은 이토록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AI와의 공존 이후 인간은 경계에 서 있습니다. 동물보다 나약한 신체, AI보다 느리고 부정확한 지능, 그 사이 어딘가에 인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호한 지점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계와 달리, 인간은 서로의 속마음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감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상상 속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언어를 통해 소통하며,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표현합니다.
결국,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AI처럼 정답과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희로애락이 담긴 과정의 드라마가 생깁니다. 망설이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번거로운 여정 속에서 우리만의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서사는 주인공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동료가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하며, 때로는 경쟁하는 빌런도 필요합니다. AI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주인공성을 일깨워줄 만남이 필요합니다. 서문에서 언급했던 바워만의 문장을 살짝 변주해 보고 싶어집니다.
"신체가 있는 한, 불완전한 우리의 움직임은 계속된다.
그리고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